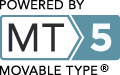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군대 갔다 와야 사람된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런 말은 많이 안 하는것 같긴 하다. 특별히 무엇에 불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군대 가기 귀찮으니까 얘기 안 한다. 하지만 이런 말에 스며있는 '군바리정신'의 유령은 아직 우리들 사이를 떠돌다 자신이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곤 한다.
군대가 사람 만든다는 이야기는 1950년대의 산물이라고 한다. 북에서 내려와 삶의 근거가 없거나 교육받지 못한 농촌 청년들은 군에 입대해 신분 상승을 꿈꿨던 것이다. 문맹에다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이들은 군대에서 글을 배우고, 기계문명을 접하고, 집단생활의 규율을 익혔다.
그러니까 이는 1960년대 초까지의 처세술에서 나온 격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이다. 전쟁을 겪은지 5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낡은 배경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그럴듯하게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말은 회자되면서 현실을 재단하고 결국 스스로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일단 처음 입대하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상관의 지시에 복종해야만 한다. (군대에 안 가봤으니 들은 풍월이긴 하다. 하지만 대체로 비슷비슷한 경험담들을 들어 왔고, 여기 언급하는 정도는 거의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다.) 아무리 꼬운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틀렸다 싶어도 함부로 나설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순들의 결정판을 체험하지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의 무게 또한 실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체념하고 순종하는 세월이 얼마간 흐른 후에 후임들이 들어오면 이제 차례가 바뀌어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순서가 된다. 마음에 안 들면 적당히 굴려주고, 힘든 일은 나는 시키기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졸병일 때 느꼈던 부당함과 아니꼬움을 바로 자신이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편안하기 그지 없는 관행의 유혹에 살짝 눈감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2년 몇 개월간을 살다 나오면 어느새 권위적인 조직체계에 아주 적합한 습성이 몸에 배어 나오게 된다. '오호라, 이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을 군대에서 배웠구나!' 그래서 아직도 군대가 사람 만든다는 소리를 눈도 깜짝하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군대는 전쟁을 위한 조직이다. 전쟁은 강자가 약자를 철저히 밟아버리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비인간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아군이 밀리고 있는데 장교부터 사병까지 모여서 동등한 권리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후퇴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토론한다는 건 좀 우스운 상황이다. 조직화된 위계 속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판단은 순간에,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반성은 하던지 말던지.
하지만 우리가 살고싶어하는 세상은 어떻게든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지 전쟁터 같은 곳은 아니다. 인간적인 세상을 만들려면 인간적인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수평적인 인간관계, 자유로운 의사소통, 개성의 존중...이런 교과서적인 원칙들은 당연해 보여서 우습기까지 하지만 '하면된다'식의 군사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실현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나는 1급 현역이지만 어떻게든 군대는 가지 않을 생각이다. 그리고 내가 군대에 가지 않을 작정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발 더 디뎌서, 나는 군대라는 조직은 근본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징병제를 반대한다.
-=-=-=-=-=-=-=-=-=-=-=-=-=-=-=-=-=-=-=-=-
우리나라는 이상한 곳이다.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면 안 된댄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노벨상이랑 바꿔먹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