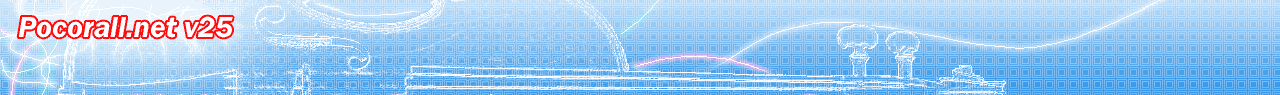[홍세화] 그대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
[특별칼럼]그대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 - 홍세화
그대는 대학에 입학했다. 한국의 수많은 무식한 대학생의 대열에 합류한 것
이다. 지금까지 그대는 12년 동안 줄세우기 경쟁시험에서 앞부분을 차지하
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고 수학 공식을 풀었으며 주
입식 교육을 받아들였다. 선행학습,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등 학습노동에
시달렸으며 사교육비로 부모님 재산을 축냈다.
그것은 시험문제 풀이 요령을 익힌 노동이었지 공부가 아니었다. 그대는
그 동안 고전 한 권 제대로 읽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대의
대학 주위를 둘러 보라. 그 곳이 대학가인가? 12년 동안 고생한 그대를 위
해 마련된 '먹고 마시고 놀자'판의 위락시설 아니던가.
그대가 입학한 대학과 학과는 그대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대가 선택 당한
것이다. 줄세우기 경쟁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그대의 성적
을 보고 대학과 학과가 그대를 선택한 것이다. '적성' 따라 학과를 선택하
는 게 아니라 '성적' 따라, 그리고 제비 따라 강남 가듯 시류 따라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 그대는 지금까지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고전을 앞으로
도 읽을 의사가 별로 없다.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영어, 중국어를 배워야 취직을 잘 할 수 있어 입학했을 뿐, 세익스피어, 밀
턴을 읽거나 두보, 이백과 벗하기 위해 입학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차라
리 어학원에 다니는 편이 좋겠는데, 이러한 점은 다른 학과 입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인문학의 위기'가 왜 중요한 물음인지 알지 못하는 그대
는 인간에 대한 물음 한 번 던져보지 않은 채, 철학과, 사회학과, 역사학
과, 정치학과, 경제학과를 선택했고, 사회와 경제에 대해 무식한 그대가 시
류에 영합하여 경영학과,행정학과를 선택했고 의대, 약대를 선택했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대의 무식은 특기할 만한데, 왜 우리에게 현대사가
중요한지 모를 만큼 철저히 무식하다. 그대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가 '민족지'를 참칭하는 동안 진정한 민족지였던 <민족일보>가 어떻게 압살
되었는지 모르고, 보도연맹과 보도지침이 어떻게 다른지 모른다. 그대는 민
족적 정체성이나 사회경제적 정체성에 대해 그 어떤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을 만큼 무식하다.
그대는 무식하지만 대중문화의 혜택을 듬뿍 받아 스스로 무식하다고 믿지
않는다. 20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읽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무식하다고 인정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중문화가 토해내는 수많은 '정보'와 진실된 '앎'이
혼동돼 아무도 스스로 무식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물며 대학생인데! "당
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에 익숙한 그대는 '물질적 가치'를 '인간적 가
치'로 이미 치환했다. 물질만 획득할 수 있으면 그만이지, 자신의 무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대의 이름은 무식한 대학생. 그대가 무지의 폐쇄회로에서 벗어날 수 있
을 것인가. 그것은 그대에게 달려 있다. 좋은 선배를 만나고 좋은 동아리
를 선택하려 하는가, 그리고 대학가에서 그대가 찾기 어려운 책방을 열심
히 찾아내려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다.
출처 : 대학생 신문
........................................................................
우리 교육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은 보수적인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무슨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을 들어서 어렴풋이 알고 있을 뿐, 몸으로 절실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학생, 학부모, 선생, 교육관료들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개혁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남들이 그러니까 내놓는 교육관료들의 개혁정책이란, 소경이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낫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개혁의 필요성을 모르는 학부모와 선생들에게 '개혁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안 좋은 선례만 남길 뿐이다.
진보는 진보의 필요성을 몸으로 절실하게 느끼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 말이 필요없는 체험이 바탕이 되면 논리는 그 다음에 저절로 세워진다. 홍세화는 우리나라 현실이 지긋지긋하다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기 이전에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다. 진중권처럼 이론적으로 화려하지도, 강준만처럼 많은 양을 쓰지도 않지만, 그의 글 한 편 한 편이 묵직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모순된 현실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섬세한 감수성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2003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