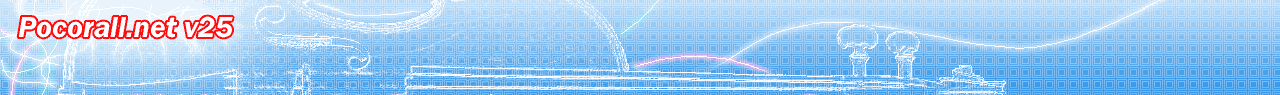나쁜 남자
제목은 '서툰남자'가 더 어울릴 것 같다. 한기의 사랑은 기습 키스만큼이나 시종 서툰 수법으로 일관해서 서로에게 갈수록 깊은 상처를 새기는 것이었다. 그라고 왜 여대생과의 발랄한 연애를 꿈꾸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건달에다 기둥서방에다 말도 제대로 못 하는 한기에게, 이미 행복한 선화가 마음을 돌릴 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한기는 그만의 방법으로 선화를 곁에 묶었다. 하지만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한기에게 선화는 거울 너머로밖에 볼 수 없는 환상이었다.
한 장면을 제외하고는 한 마디도 하지 않는 한기의 욕망을 말로 드러내는 인물이 정태다. 선화에게 사랑한다고 하고, 탈출시켜 주고, 도망간 뒤에는 돌아오길 바란다. 한기는 그에게 "깡패새끼가 무슨 사랑이야"라고 소리치지만, 실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자신을 찌른 정태의 칼을 숨겨주는 것도 그의 아픔을 유일하게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배려가 아닐지.
한기는 결국 선화를 절망하게 만듦으로써 그에게 의지하도록 했다. 지독하게 나쁜 남자이고 서툰 남자이지만, 그 안에 배여있는 순수에 이끌린 것일까? 찢어진 화집에서, 얼굴 없는 사진에서, 아이처럼 잠든 한기의 모습에서 선화는 조금씩 그에게 이끌린다. 이런 걸 두고 미운정이라고 하나보다. 그녀는 거울을 깸으로써 한없이 어진 그림자에 응답한다. 이렇게 한기의 환상은 현실이 되었다.
김기덕 영화에서 나오는 신체에 대한 폭력은 마음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수단이다. '나 이렇게 마음이 아파'라는 것을 관객의 신경에 직접 이식시킴으로써 질질 우는 눈물씬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섬'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정말로 '낚았'고, '수취인불명'에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정말로 '먹었'고, '나쁜남자'에서는 장이 끊어지는 듯하고 머리가 터질 듯한 아픔을 진짜로 머리를 깨고 배를 찌르는 수법으로 보여준다. 비위가 상하는 느낌은 거역할 수 없지만, 공포영화에서 보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 장면들은 관객을 함께 아파하도록 이끌어간다.
이 영화는 감독의 전작에 비해 그리 강렬하지는 않았다. 소재선택과 전략상의 문제였던것 같다. 지겹게 다뤄지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만 남은 조폭을 소재로 한 점이라가 과감한 포스터 같은 것으로 쓸데없는 부류들로부터 말만 시끄러워질 부담만 안은 것 같다. 실제로 내 옆에 앉았던 아줌마는 내내 '어휴..쟤는 부모도 없나', '어쩜 저렇게 영화를 만든대'하는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나가지도 않고 나를 괴롭혔다. 언제나 '물'이 중요한 것 같다. 이해해주지 못할 관객은 굳이 불러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2002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