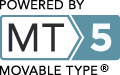지난 밤 꿈 속에서 연작 회화를 보았다. 적막하면서도 포근한 느낌을 주는 유화였는데, 그 연작은 어떤 노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자신의 관을 만들었다. 명이라도 받은 듯이, 느리지만 꾸준하게 관을 만들어간 노파는, 죽은 뒤에 첼로를 안은 채로 그 관에 누웠다. 고독하지만 우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은 노파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장면 이후로 얼핏 잠을 깼다. 그리고 꿈에서 받은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한참 동안이나 그 감흥에 벅차 있었다.
비석에 넣는 문구는 후대에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관은 망자 자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의 관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삶이 끝나기 직전, 그동안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