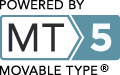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 보르헤스의 환상문학
보르헤스가 책벌레이며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시력을 잃어버린 것을 비유하여 '문학계의 베토벤'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수긍이 가는 구석이 있다. 상상 속에서만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 베토벤이 주변과 소통의 기록을 음악으로 남기기 보다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여 음악으로 표현했다면, 보르헤스 역시 삶 속의 구체적인 사건들이나 특정한 대상들을 서사하고 묘사하기 보다는 삶을 편집하고 추상한 책의 세계에서 자기 작품의 소재를 찾았다.
그의 소설이 다루는 무대는 인류가 지식으로 세운 세계이다. 그는 소설 속에서 세계를 도서관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백과사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묘사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진면목을 담은 작은 지점을 묘사하기도 한다. 지적 세계에서의 사물은 텍스트이고 사건은 해석이다. 그는 수많은 저자들과 문헌들을 요리사가 밀가루 반죽을 대하듯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해석하여 원저자도 생각하지 못했을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게다가 좀처럼 익살을 부리지 않는 베토벤과 달리, 텍스트에 엉뚱한 해석을 붙여 놓거나, 거짓 문헌이나 작가를 언급하며 능청을 떠는 모습은 그의 빛나는 재치를 보여준다. 그는 이런 지적인 놀이를 소설의 형식으로 펴냈고, 평론가들은 이것을 지배적 해석을 거부하는 포스트모던의 원류로 받들었다.
* 알렙
보르헤스는 세 번째 소설집의 표제 소설인 <알렙>에서 시공간의 구체성을 초월하여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알렙이라는 신기한 물건을 고안한다. 그것은 세계의 일부분이지만 세계에 대한 완벽한 표상을 담고 있다. 그리고 사물의 감춰진 부분을 유추해야 할 필요 없이 물체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동시에 보여준다. 알렙은 바로 학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암시한다. 플라톤이 지적한 이래로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꿈꿔 온 현상 너머의 세계를 속 시원히 보여주는 요지경이 그것이다.
하지만 알렙은 도대체가 상상도 하기 힘든 것이다. 어떻게 사물의 모든 면목을 동시에 가려짐없이 볼 수 있을까? 한정된 공간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을 담으면서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알렙은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른다. 보르헤스가 미술가라면 절대 알렙과 비슷한 것도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화감독이었어도 어설프고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것이다. <매트릭스>에서 'oracle', 'the One'(一者), 'back door'같은 개념들이 묘하게 속화되어 표현되는 것을 생각하면, 알렙을 설명하기 위해 순수하게 기호를 다루는 문학이라는 형식을 활용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알렙>은 고르기아스가 지적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알더라도 전달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문학적으로 구체화한다. 보르헤스는 작품 속에서 알렙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중인물은 그 꿈의 장소를 목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유한한 감각으로 얼마나 그것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무한하고 초시간적인 알렙을 유한하고 순차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알렙이 궁극적 지식을 은유한다고 할 때, 알렙의 목격담을 전할 수 없고, 알렙을 보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알렙이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존재와 인식에 대한 고르기아스의 근본적인 회의와 상통한다.
보르헤스는 여기에 "알더라도 기억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지식인들의 단꿈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꿈에서 실현되기도 한다. 꿈을 깨고 나면 바로 직전까지 느꼈던 기쁨과 그것이 허구였다는 허탈감이 뒤엉켜 묘한 상태를 만들어낸다. 보르헤스는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꿈꾼 것이다. 그 꿈 속에서 좀처럼 믿기 힘든 경험을 했고, 그 경험마저 기억이 희미해짐에 따라 사라져 가면서 결국엔 어렴풋한 인상만 남았다. 알렙은 연인 베아뜨리스에 관한 기억과 마찬가지로 잊혀지지도 실현되지도 않는 아련한 곳에서 책을 벗삼은 사람들을 계속 유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