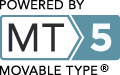누구나 그렇긴 하겠지만, 내가 관현악단에 들어간 것에도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쇼팽에 완전히 빠져있어서 어떻게든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었다. 혼자 피아노를 치기가 답답해서 입학하기 전부터 동아리를 찾았는데, 대개 그렇듯이 초보자가 피아노를 배울 수 있을만한 동아리는 없었다. 그나마 눈에 들어온 것이 관현악단. 마침 집에서 놀고 있는 바이올린이 생각나서 꿩대신 닭이라도 잡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벼이 들어간 곳이었다.
그 때부터 정신없이 열리는 인간관계속에 빠져들어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패기있고, 윤택한 생활을 즐길 줄 알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유로워 보였다. 집단으로서의 동아리도 그때까지 내가 본 어느 곳보다 활기있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필요할 때 통제도 잘 되어서, 여기서는 뭔가 되겠다는 인상이 강하게 꽂혀왔다. 수업이 끝나면 써클실로 달려가서는 연습을 하거나 수다를 떨다가 저녁을 얻어먹고 해가 다 진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심지어는 휴학을 한 2학기에도 일주일에 세 번씩은 꼭 써클실에 얼굴을 내밀곤 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루종일 써클 일을 하느라 별 소득 없이 시간을 보내도 아쉽지 않았고, 휴학하고 써클실을 들낙거리는 사이에 졸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 안에만 들어가면 시간이 정지해 있었다. 그곳이 집보다 편했다. 잠자는 시간과 주말을 빼자면 심지어 집보다 오래 머무는 곳이기도 했다.
작년 봄에 있던 연주회 이후, 나는 써클실로의 발길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 미래에 대한 욕심,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미련, 휴학중이라 써클 일 말고는 학교에 갈 일이 없는 처지, 새로 하게된 팀파니에 대한 부담, 참여가 줄어드는 동기들, 써클사람들과 맺어온 관계와는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찾고싶은 마음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내 행동을 바꿔 놓았다. 이제는 수업이 일찍 끝나서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그냥 피곤한 척 집으로 오는 마을버스에 몸을 싣는다. 가끔, 마음먹고 찾아간 써클실에는 얼굴 설익은 후배들이 돌아보고 인사만 하고는 다시 제 하던 일에 관심을 돌린다. 친한척 말 붙이고 데려나가 음료수라도 한 캔 사주는 게 선배의 몫이긴 하지만, 열흘이나 보름쯤 뒤에 다시 찾아갔을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못 만나면 또 그 다음 열흘이 지나가버리는 관계일 뿐이라는게 서글프다.
마지막으로 써클실을 찾았던 때가 두 달 전이다. 소중한 몇몇 친구들과만 계속 연락할 뿐, 동아리 활동은 거의 내 관심에서 몰려날 지경이다. 그 때의 기억들은 무엇이라고 남겨야 할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노력을 쏟아붓는 저 연주회는 정말 더 해볼만한 일일까? 나는 써클활동을 안 하는 것일까, 못 하는 것일까? 다시 예전처럼 활동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철없이 뛰어들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다.
2002년 8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