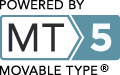세계 창조의 작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을 만들어 심어 둘 필요가 있다...중략...(우리는 먼저, 그 세계가 왕자의 키스 한 번으로 공주가 되살아날 수 있는 세계인지, 아니면 마녀의 키스 한 번으로 되살아날 수 있는 세계인지, 공주의 키스가 개구리, 혹은 아르마딜로를 왕자로 변하게 할 수 있는 세계인지를 알아야 한다)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창작노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는 언제나 날 혼란스럽게 한다. 작품마다 워낙 독창적인 판타지의 세계를 펼쳐내다 보니 그 세계의 규칙에 익숙해지는 데에만 온 정신이 휘둘리다 어느새 결말에 이른다. 이야기가 있는 장르의 작품에서 보통 이런 조건들은 앞부분에 주어지거나 일상적으로 대부분 공감하는 것들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의 영화에서는 전혀 접해본 일이 없는 세계의 규칙들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등장한다. 가령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이런 조건이 줄지어 나온다. 인간이 다리를 건널 때에는 숨을 멈춰야 한다, 인간임을 들켰을 경우에는 유바바에게 일자리를 얻어야 살 수 있다, 예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강의 정령이 준 약을 먹으면 돼지가 원래의 사람으로 되돌아온다, 계약조건에 따라 돼지가 된 부모를 알아봐야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과감한 세계관을 가진 판타지는 줄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계 자체이다. '이 다음엔 어떻게 될까?'라는 인과에 기반한 기대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뭐가 나올까?'라는 초시간적인 설정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스타워즈를 볼 때 갖게 되던 생각과 통하는 면이 있다.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른 세계를 그리면서 탄탄한 구성을 구축할 수는 없을까? <장미의 이름>을 떠올려 보자. 14세기라는 낮선 시대설정임에도 작가는 탐정소설 형식을 취했다. 탐정소설은 '누가 범인인가?'를 알아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추리하는 과정은 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으로 주어진 것들이 독자에게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작가는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당시의 정치적, 문화적인 정황과 수도원의 건물 위치와 구조, 재료, 인물의 성격과 일과까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차근차근 일러주면서 사건을 엮어나갈 토대를 마련한다. 초기조건이 주어지면 실험기구를 실행시키고 어떤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관찰하는 일이 남았다. 수도원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윌리엄 수도사는 여러 방도로 정보를 수집하며 사건의 열쇠를 궁리해나간다.
이런 방식은 규칙을 다 배우고 나서 두는 장기와 같다. 규칙을 알고 있으므로 인과의 사슬을 함께 짚으면서 줄거리를 따라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반면에 스타워즈 시리즈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들은 일단 게임을 진행면서 규칙을 배워나가는 장기다. 말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떠도는 사건의 집합만을 관찰하는 식이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머리를 어지럽히는데도 한편으로 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부족한 논리적 구성 때문이 아닐까?
2002년 7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