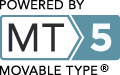오후 6시 15분. 잠은 아침에도 잤는데도 십 년만에 누워보는 것 같다. 실은 일 년만에 다니는 학교 탓이다. 자, 한 해동안 재충전을 했으니 이제 활기차게 다녀야지! 라는 식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듯 내겐 허울이다. 실은 오늘 02학번 대면식이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 (실은 그런게 있다는 것도 방금 전에 알았다 (실은 이미 알았다고 해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은 철저히 몰아내자.
배도 채웠고, 몸도 씻었고, 읽을 만한 책들도 팔을 뻗어서 닿는 곳에 있다. 약간만 더 뻗으면 불도 끌 수 있다. 잠잘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여도 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문재 시집이 한 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무드에서는 낱말 하나하나를 씹어삼킬 수 있을텐데... 나가서 사올까? 이미 늦었다.
로비 라카토쉬가 연주한
작년 이맘때엔 서 있는 기차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더랬다. 그래서 결국은 일상을 벗어나자마자 이틀동안 종일 기차를 탔다. 왕복 10시간이 넘었는데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화이트데이가 갑자기 새삼스러워져서? 게걸스러운 나의 지식욕에 지쳐서? 고루하고 시간낭비에 모범격인 학교 수업이 징글징글해서?
하지만 일 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아니다. 바뀐게 있다면 이제는 고독에도 신물이 나서 혼자 떠나는 여행도 더이상 가고 싶지 않다는 것.
희한하게도 2001년 3월 중순의 일은 날짜별로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작년 이맘때 종로에서 만났던 J형. 마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도 꼭히 기회가 없으면 그냥 흘리고 마는 것이 내 흠이다. J형도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중 하나였고, 바로 며칠 전에 만났을 때에도 길지 않은 안부인사로 흘러갔다. 이심전심일까? 아니면 인사치레였을까? 학교 근처에 오거든 연락 한 번 하라던 당부가 여운으로 남아 있다. 새순이 돋으면 맑은 날을 택해서 형을 찾아가 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2002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