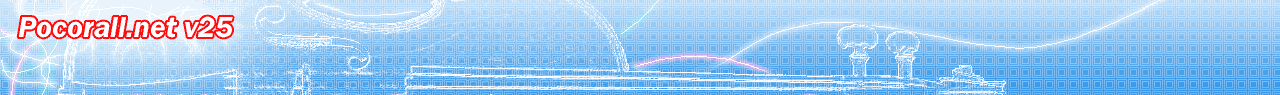400번의 구타
지금까지 나는 비교적 순탄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아주 야만적인 환경에 처했던 기억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때가 가장 꽃다운 시기여야 할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이고, 대학은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직장은 결혼과 자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슬프지만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다. 이 도도한 '주류'의 도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그 고등학교 시절이다.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처럼 지루하고 가치없는 삶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대학생이나 직장인에 비해 그런 강요를 거부하기 힘든 위치에 있다. 주류의 사고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체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생들이 자신의 행위를 교육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학년 때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학생주임이 즐겨 쓰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좋은 대학 가려고 이 학교에 들어온거지? 내가 알기론 그래. 안 그럴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나는 "잘못 왔네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열 번도 더 일어났었다. 이따위를 교육이라고 받고 있어야 하다니, 정말로 엉덩이가 반쯤 들썩거리고 입이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참았다.
요즘은 중고등학교 선생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그만큼 안락한 직장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기득권을 위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선생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선생들이 차지한 고등학교는 어떻게 변할까?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처럼 앞뒤 안 가리는 폭력적인 체벌은 많이 줄었다는데, 인간적이고 교육적으로 되었다고 좋아해야 할까? 나는 불현듯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 떠오른다. 교육의 탈을 쓴 노예의 윤리는 더 지능적으로 학생들에게 침투하는지도 모른다.
* * *
<400번의 구타>의 마지막 장면. 발자크에 매료되었던 한 소년이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소년원에 수감된다. 소년은 운동장에서 공을 줍는 시늉을 하다가 소년원에서 도망쳐 나온다. 그리고 달린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언덕을 넘고, 목장을 지나고, 바다가 나올 때까지. 카메라는 긴 시간을 말없이 소년과 함께 달린다. 내 20대의 여정도 고등학생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탈출하려는 몸부림이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고등학교 선생들에게 사은의 뜻을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