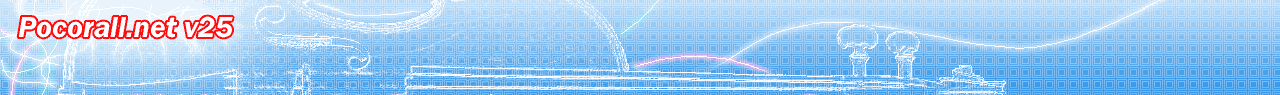해안선
김기덕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그와 나는 <섬>에서 잠깐 교차했던 것일까? 오늘 본 <해안선> 역시 보는 이를 심히 불편하게 만드는 점에서는 예전과 같았지만, 러닝타임을 장악하는 힘이 많이 부쳐 보인다.
김기덕이 품고 있는 상처는 사회모순으로부터의 외상이라기 보다는 몸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자라나는 암과 같은 것이다. 궁핍했지만 이렇다할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청년기를 지내온 그의 이력을 볼 때, 자신의 고통을 시대의 아픔과 연관지으려는 시도는 어울리지 않기 십상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감독으로 이창동 감독을 꼽았다. <해안선>은 아마도 <박하사탕>의 주제를 이어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등장인물들은 미쳐가고, 카메라는 그들과의 최소한의 거리도 확보하지 못하고 함께 울렁거린다. 분단의 아픔을 담아내기에는 이 영화의 구성요소들은 너무나 개인적이다.
렌즈가 쓰였다고 해서 현미경을 망원경으로 쓸 수는 없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