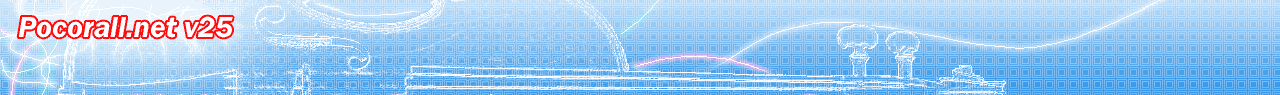[이문재] 섬의 북쪽 (화살기도5)
긴 치마 벗어 놓고 나간 듯 푸르스름한 저녁이 수면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빛 치맛자락 밟고 걸어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무인도 우물 없다는 댓섬에서 뻐꾸기 울음이 건너오는 것이었습니다 뒤란에서 여름꽃들이 터지고들 있었습니다
한낮에는 대못 같은 빗줄기가 꽂혀 생철 지붕이 요란했더랬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는 이 섬을 수장시키지 못하게 되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듯 대못을 박아대는 것 같았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나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방이 캄캄해져 있었고 나는 당신을 생각하던 마음을 마당에 내다 놓고 대못에 박히도록 했습니다 나는 흠뻑 잦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까닭 없이 흥건했던가요 왜 그토록 죽음의 왼손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가까운 바다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대못들을 한 움큼씩 삼키고 또 삼켜 한 겹 오래된 소금기를 없앴는지 한 뼘쯤 맑아져 있었습니다
벗어 놓고 간 치맛자락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듯 뻐꾸기가 또 웁니다
내일 아침 내가 나가면 이 섬도 무인도가 됩니다
당분간 나는 무진 애를 쓰며 멍하니 있으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