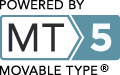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미안해"
초콜렛을 받아든 그녀는 뜻밖의 말을 남겼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잘못 집어타고 엉뚱한 곳에 내려 밤거리를 걸었다. 그리고 마치 극적 반전으로 끝나는 영화를 본 것처럼 지난 기억을 허겁지겁 되짚어 나갔다. 만남은 헤어짐을 기념하기 위한 전야제이다. 수줍게 손을 맞잡던 코엑스몰의 지하도, 다정한 미소, 밤늦게 나눴던 이야기들, 언젠가 꼭 가보자던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팥죽집은 마치 오늘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머릿속으로 쏟아져 내려왔다.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퍼즐 조각을 흩어놓고 새로 맞추어야 했다. 그러나 조각들은 지구가 아닌 곳에서 우리말이 아닌 언어로 방송되는 TV화면처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나는 필사적이 되었다. 적당히 대답하고 끊었던 짧은 통화마저도 나는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했다. 너무 많아서 지웠던, 그러나 이제 다시 받을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기억 속에서 건져내어 머릿속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떠올렸다 지우고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문자를 방금 받은 것 같은 거짓 행복감에 슬며시 웃음을 짓기도 했다.
며칠이 지났다.
내 감각 기관을 스쳐간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외울 정도가 되면서 나는 이제 어떤 진부한 깨달음을 서서히 얻어가고 있다. 그녀와 함께 지냈던 시간 속에는 부서질 것 같은 투명한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다. 절정이 되는가 싶으면 곧 떨어지고야 마는 벚꽃과도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그 서늘한 순수를 앞질러 깨닫기엔 아이처럼 서툴렀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흘러간 시간에 덧없는 그물을 던지며, 문장마다 고통을 새겨넣어 반성문과 같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