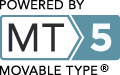아름다운 당신. 그대를 생각하면 아름다운 것은 참 슬프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가 내린다. 하지만 슬프다고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그게 오늘은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 슬픔과 힘. 슬픔이 힘으로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아름다움이었음을 내가 느낀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음악이 흐르며, 그대와 나 사이를 슬픔의 힘으로, 육감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막스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1번 2악장이다.
한 토막 글이 나를 4년 전으로 되돌려 놓았다. 닳아 빠진 사진첩 같은 기억. 그 속에 있던 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낮선 곳에서 낮선 일을 하고 있던 나는 누구였을까. 잊을 뻔했던 과거가 생생하게 덮쳐오는 만큼 어제까지의 내가 아득하다. 그 때의 그 음악과 함께, 냄새가 난다. 눈에 선하다. 퀴퀴한 지하실 냄새가 나던 써클실, 낙산 캠프, 종로3가, 인사동, 그리고...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외로운 것이라 했다. 그럼에도 기꺼이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그 시절이 다시 온다면. 그 분노와 후회와 공허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그 음악을 다시 연주할 수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