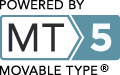고전 사상서는 물론이거니와, 서점에서 잘 나가는 시사문제를 다룬 비평서만 해도 작자의 요지와 논리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읽어야 하고, 읽은 다음에는 몇 마디 코멘트라도 할 만큼 내용에 대해 소화가 되어 있어야 제대로 읽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서가 취미"라고 할 때의 그 뉘앙스 그대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아하게 책을 읽고 싶다면 이런 류의 책을 선택할 경우 그대로 골아 떨어지기 십상이지요.
세상에 설렁설렁 해서 되는 일은 흔치 않고, 배움이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겉 핥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수박 같은게 있는가 하면, 겉만 핥아도 달콤한 것이 조금씩 나오는 사탕 같은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과 사회를 다루는 학문 중에서도 겉 핥는 맛이 그래도 쏠쏠한 것이 역사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복잡한 논리에 골치 썩고싶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옛날 이야기 듣듯이 술술 넘겨들어도 뭔가 남겨가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도전했다가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책값만 아까운 철학 같은 분야와는 달리, 어떻게든 본전은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역사학인것 같습니다.
역사 이야기 하면 흔히 다뤄지는 정치사는 너무 흔해서 그런지,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그런지 따분하죠. 좀 더 인간적인 모습들이 배어 나와서일까요? 읽는 재미가 그래도 쏠쏠한 것이 정치사의 뒷 이야기나, 생활사, 문화사 같은 주제들입니다.
그 중에 생활사는 당시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과 가장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인문학의 정신에 가장 잘 들어맞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럽의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를 다룬 생활사 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립 아리에스와 조르주 뒤비 등의 역사가들이 함께 저술한 <사생활의 역사>입니다. 이 책은 두터운 책 네 권 분량의 압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례로, 로마 시대에는 신뢰하는 노예에게는 주인 재산에 대한 집행권과 법정에 출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도 할 정도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인정받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으로, 늘 노예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주인이 "나는 혼자 산책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만큼 존재감이 없는 인간이 그들이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생활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당대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로마 시대엔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아기를 갖다 버리기도 했다는 사실을 용납하기가 힘들테지요. 자식을 미워했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 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자식을 버리는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구성이 갖는 치밀함이라던가, 주제와 서술방식의 독창성이라던가, 저자들의 약력이라던가, 아날 학파 미시사 연구와의 차별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재주도 없고요. 사실을 말하자면 1권의 절반도 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입에 올리고 한참을 떠드는 이유는,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논지에 귀기울이느라 신경쓰지 않아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술술 읽어넘어가는 것만으로 옛 사람들의 생활들이 세심하게 선택된 도판들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 때에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구나'하고 무릎을 치거나, 지금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행동양식을 보면서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대부터 골라서 읽어도 상관없고, 읽다가 그만두고 한참 뒤에 읽어도 읽는 재미가 상하지 않습니다. 두께에 비해 턱없이 부담이 없는, 그러면서도 꿀맛 같은 깊이가 있는 드문 책이 <사생활의 역사>입니다.
2003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