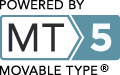서로의 철학에 대한 교양의 수준을 잘 모르는 경우에, 내게 누가 철학 얘기를 꺼내면 그냥 태연하게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겨왔다. 상대가 아주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면 나보다 훨씬 깊이있게 사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떠들면서 잘난척 주름 세우거나 그러다 제대로 된 임자(?) 만나서 혼나는 경우는 별로 보기 안 좋은 풍경 아닌가.
세상 일을 잠시 모른척, 백수생활을 누리면서 문득 책꽃이를 보니 소위 철학서적들이 상당히 꽂혀있는 것을 이제 완전 시치미 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만큼 시간을 들여 한 일이라면 대체 이게 무엇이며 왜 하는가에 대한 변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하하...그래 변명이다. 시작할 때 그런 거 안 따지고 시작했고, 거창한 의미부여 같은것도 장식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혀 이성에 근거하지 않고) 막연하게 나를 지배한다. 어쨌거나 누가 내 책꽂이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었을때 우물우물 넘기기는 좀 우습다 싶어 지금부터 변명을 억지로 뚜드려맞춰낼 테다.
산이 있다.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산로를 따라 고개를 넘어 산 너머로 간다. 다른 사람들은 터널을 뚫는다던지 정상을 한번 찍고 간다던지 일부러 험한 쪽을 골라 암벽등반을 한다던지...어떤 방법을 쓰든 산을 넘어갈 방법을 궁리할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산 기슭을 어슬렁거리면서 꽃 피는 것을 보고, 물 흐르는 것도 보고, 구름 떠가는 것도 보고...다른 등산객들도 보다가 산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먹는 사람이다. 산을 그리 급하게 넘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없는 팔자 늘어진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내가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판에 짜라투스트라가 어떻게 말했는지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여유만만한 철학자들은 이리저리 산책하듯 산 주변을 거닐다가 때로 남들이 목적지라 생각하는 곳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거기까지 이르는데 턱없이 먼 길로 돌아왔을 것이다. 목적지보다는 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는 산에 대해 깊이있는 성찰을 해왔을 테고, 산을 대할 줄을 알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산은 매우 다채롭고 변화무쌍하다. 그만큼 산은 넘기에 힘든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느낌까지 주기도 한다. 벌벌 떨며 한 발 한 발 내딛다가 뒤돌아보며 어느새 한 고개를 넘었다고 안도할 때, 내 앞에는 어김없이 다른 산이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쉬면서 산을 좀 더 알고 싶었다. 등산로가 놓인 산이 아닌, 산의 다른 모습을.
이렇게 철학자들의 몹시 한가해 보이는 사유와 내 삶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연결된다. 한 가지 상황과 한 가지 사유를 연관시켜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산에 대한 다양한 밑그림과의 대조과정이 다양한 상황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는 지점에서 연관성을 찾은 것이 바로 그 열쇠였다.
철학자들은 저마다의 탐험기를 하늘에 새겨둔다. 나는 틈이 날 때마다 자리를 펴고 누워 그들의 흔적을 더듬으며 나만의 별자리를 그린다. 언젠가 하늘 가득 밝게 수놓아진 별자리들에 힘입어 좀 더 의연히 산을 누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